[2023 겨울 자몽 시리즈] 01. 인종 차별과 차이, 그 너머
자연대 홍보기자단 자:몽 5기 | 김채원
‘인종 간 생물학적 우열이 존재함은 자명하다’.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쉽게 답이 떠오르는가? 그렇다면, ‘인종 간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말은 어떠한가?
인종(race)의 정의와 상징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인종이라는 단어는 에스파냐가 유대인들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내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지닌 혈통(raza)’으로 지칭하며 출현했다. 정복과 퇴출을 생물학적 특성이라는 비교적 영구적인 성질의 근거로 정당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인종주의의 시초로 자리잡아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 사상을 뒷받침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인종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종간 우열의 증명이 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과열된 인종주의는 전쟁으로 이어져, 곧이어 전쟁의 정당화를 위한 각종 인종 연구를 낳았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고, 사람들은 이 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인종편견의 종식을 목표로 ‘인종에 관한 성명(Statement on race)’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인종은 실존하지 않음을 과학이 담보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과학자들의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는다. 세계는 ‘인종이란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회귀하며, 인종 개념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간다.
제국주의의 대두와 진화론
19세기 유럽 강대국들의 경쟁은 금융 자본주의의 대두와 국가 간 힘의 관계의 변화로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기반으로 제국주의가 탄생했다. 제국주의의 동력이자 근거가 되는 요인 중 하나는 인종적 우월의식이었다.
인종적 우월의식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유색인종보다 백인이 우월하고, 따라서 차별과 정복이 정당하다는 생각은 찰스 로버트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의 자연선택설에 기초한 생물학적 진화론에 근거를 두었다. 다윈은 저서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에서 자연계의 생물 간에는 변이가 존재하고, 변이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를 만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환경에 적응한 개체만이 살아남아 번성하여,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의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흡수한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은 적자생존의 결과로 ‘고등’한 존재가 출현한다는 법칙을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하고자 했다. 사회진화론의 논리대로라면, 인간도 경쟁을 통해 강한 인종만이 살아남으면서 ‘진보’할 수 있는 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윈은 진화를 진보와 연관짓지 않았다는 것이다. 덧붙여 ‘가장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가장 똑똑하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응을 가장 잘 하는 개체만이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을 미루어 다윈 진화론의 ‘적자’는 강자가 아니라 적응력이 뛰어난 종이었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은 제국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었으므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개념을 혼합하여 강하고 고등한 존재가 살아남는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진화론을 지지하기 위해 많은 생물학적 가설이 수립되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설 중 하나로 두개골의 크기가 지능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19세기 초에는 인류가 공통된 혈통에서 기원했다는 이론인 단일체론(Monogenism)과 인류의 기원은 인종별로 다르다는 다원론(Polygenism)이 공존하고 있었다. 단일체론을 주장한 프리드리히 티데만(Friedrich Tiedemann)은 1836년 흑인, 백인, 오랑우탄의 두개골을 모래로 채우고, 그 모래의 무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뇌의 크기를 추정하여 비교했다. 티데만은 흑인 뇌와 유럽인들의 뇌가 내부 구조에 차이가 없으며 흑인이 유럽인들보다 오랑우탄과 유사하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원론자였던 사무엘 조지 모턴(Samuel George Morton), 폴 브로카(Paul Broca) 등은 인종별 뇌 용량 측정에서 뇌의 평균 크기에 차이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튼은 두개골의 크기를 지능과 연관시켜 두개골이 클수록 더 똑똑하다는 가설을 세우고 인종별 두개골 1000여개를 수집하여 크기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는 두개골의 크기는 앵글로색슨족, 몽골인, 아메리카 원주민, 말레이 인종, 흑인 순으로 컸고 따라서 앵글로색슨족이 다른 인종보다 지능도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듯 상반되는 두 이론이 존재했지만, 유럽 국가들의 팽창 욕구가 심화되고 있는 당대 상황에서 다원론은 단일체론보다 우세하게 받아들여졌다. 채택된 다원론은 제국주의와 결부되어 인종 차별 정당화에 이용되었다.

모튼이 수집한 두개골의 일부. (제공 = The New York Times)
널리 퍼진 차별적 인식과, 당시 유럽 사회의 불안은 우생학(eugenics)의 탄생과도 연관이 있다. 인류학자 프랜시스 골턴(Francis Galton)은 우생학의 창시자로, 인간 종의 생식을 통제하면 인간 진화의 미래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열등한 유전 형질이 사회 내에서 확산되는 것은 인류에게 위협이 되므로 제거해야 하고, 현명한 결혼을 통해 자식 세대로 높은 지능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더 많이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생학은 전문직 계층, 기득권 계층이었던 백인을 지능이 높은 우수한 인종으로, 이민자 계층을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높은 범죄율 등의 특질을 일으킬 유전자를 가진 열등한 인종으로 여겼다. 이와 같은 주장은 결혼이나 출산을 제한하여 신체적 자유를 훼손하는 법적 제도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사회적 부적격자’들을 안락사하거나 처형하는 극단적인 방식의 생식 통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생학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당시 나치당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잡아 선동과 학살의 명분이 되었다.
인종과 인종적 편견에 관한 선언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다. 유네스코는 대전쟁이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이라는 신조의 확산으로 가능했던 전쟁이었다고 진술했다. 관련하여 1950년에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인종에 관한 성명(Statement on race)’을 제시했다. 인간 종의 본질적인 단일성을 확인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모든 인간과 민족이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생각을 담보하기 위함이었다.
성명의 구성은 자연과학보다는 사회과학에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성명 발표의 목적은 인종편견의 약화였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논의에 참여한 여러 사회과학자 중 인류학자 애슐리 몬터규(Ashley Montagu)는 생물학적 인류학 연구를 통해 인류의 평등은 생물학적인 기반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몬터규는 인종 간의 지능 차이 등 다원론의 핵심 주장은 과학적으로 논박된다고 말했다. 그의 강력한 추진으로, 사회과학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차이는 행동이나 정신적인 활동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성명에 포함하였다.
성명의 내용은 발표 전후로 여러 자연과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생물학적 차이가 행동양식과 정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언할 만한 과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생물학적 인종 개념과 사회적인 인종 개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1952년, 보다 과학적인 인종 개념을 중심으로 수정된 성명인 ‘인종 개념 : 탐구의 결과 (The Race concept: results of an inquiry)’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과학자들 사이 인종에 관한 논쟁은 계속됐다. 일각에서는 생물학적인 근거가 평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몬터규의 핵심 주장 자체를 반박하며, 생물학적 기반을 배제한 평등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생물학자인 로널드 피셔(Ronald Fisher)는 1952년의 성명에서 인구 집단 간 유전적 다형성, 즉 특정 유전자가 존재하는 빈도는 충분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정서행동적인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종 간의 차이가 없다는 전제는 성립할 수 없고, 다른 인종 간 어떻게 자원을 우호적으로 공유할 것인지가 인종의 실존 여부보돠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국제적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이후로도 성명 수정안이 여러 번 제출되었지만, 논박은 이어졌다. 1972년 유전학자 리처드 르원틴(Richard Lewontin)은 서유라시아인, 아프리카인, 동아시아인, 남아시아인, 아메리카 원주민, 오세아니아인, 호주인의 혈액 내 단백질 변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밝혔다. 단백질 변이의 85%가 같은 인종 내부의 변이에 의해 설명되고, 나머지 15%가 인종 간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간 간의 변이는 개인적 차이에 의한 것이지 인종적 차이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인종을 둘러싼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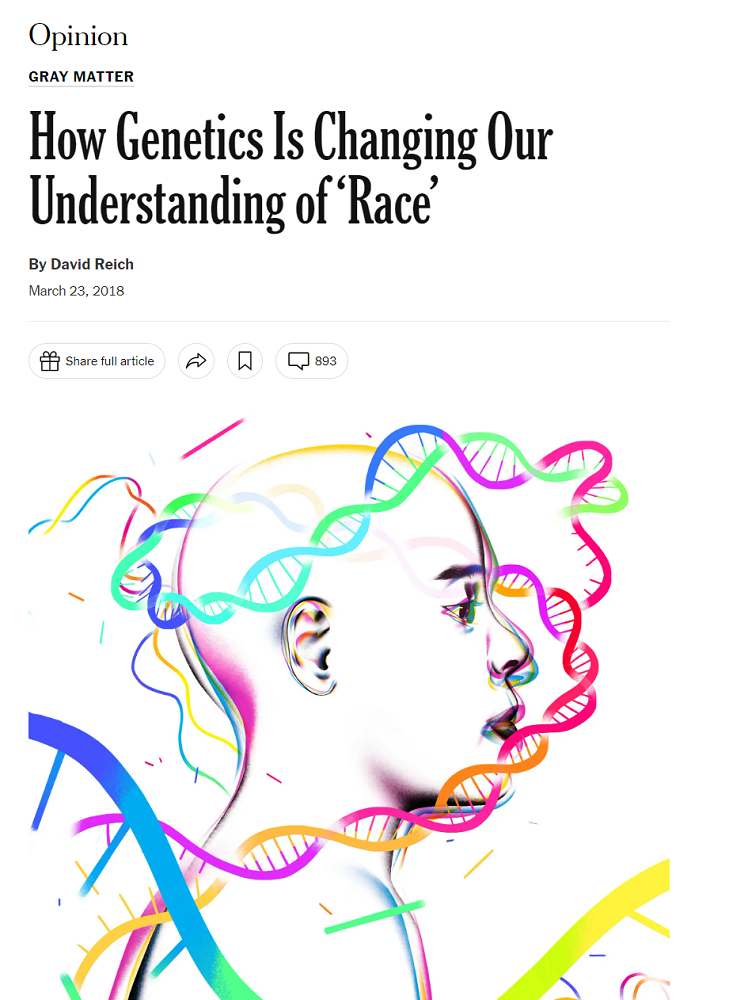
뉴욕타임즈에 기고된 데이비드 라이시의 글. (제공 = The New York Times)
‘인종’ 개념의 성립과 실존 여부는 현재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오히려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경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지금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버드대 교수 데이비스 라이시(David Reich)는 2018년 3월 뉴욕타임즈에 ‘유전자가 인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꾸는가(How Genetics Is Changing Our Understanding of ’Race’)’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라이시는 앞서 언급한 몬터규의 인종 간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학계에서 정통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비판하며, 인종 구조와 연관되는 유전적인 차이는 실존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발전된 유전학 연구 기술이 신체 크기, 질병 발병률과 같은 복잡한 특성의 인구 집단별 차이를 밝혔다는 것이다.
라이시는 예시로 자신의 연구를 들었다. 연구팀은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위험 인자의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위험 인자가 나타나는 빈도는 유럽계 미국인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게놈에 2.8%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의 서아프리카 인구에서도 발견된다. 결론적으로 인종 구성과 연관된 ‘유전적 조상’은 실존한다고 주장했다. 라이시는 결과에 대해 유전적 발견이 인종차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지만, 유전적 차이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글에는 9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으며, 대부분이 인종 연구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고 있었다. 유전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은 같은 유전적 혈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은 되지만, 역사적 인구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라이시의 유전적 조상에 초점을 둔 접근 방식은 민족적 범주와 유전적 범주를 혼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판이 이어지자 저자가 해당 글에는 인종차별주의 강화의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인종 간의 차이는 존재하는가?
인종 간의 차이는 정말 존재하는가? 현재로서는 질문에 시원한 결론을 내릴 수 없어 보인다. 문장의 단어를 하나씩 떼어 생각해보면, 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분명해진다. 먼저, ‘인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 문제가 된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인종은 집단 간 유의미한 유전자의 차이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표현형의 차이를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다. 사회적 인종 개념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문화가 집단을 구별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개념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인종의 실존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차이’의 정의이다. 예를 들자면, 상술한 사례와 같이 집단 간 유전자의 차이로 질병의 발병률이 달라진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어느 한 종류의 질병이 집단 간 다른 빈도로 발병된다는 사실은 ‘인종’을 구분짓는가?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많은 차이들이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다른 ‘인종’으로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끊이지 않는 물음 속,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질문에 대한 답과 답에서 파생되는 해석으로서의 결론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해왔다는 사실이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국가 팽창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종 간의 차이를 강조했고,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이용했다. 전쟁이 끝난 직후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던 시기에는, 인종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었다. 오늘날에는 인종 차이에 대한 연구가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오용 가능성 때문에 과학적 연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공존하게 되었다. 또다시 인종 간 차이에 대한 각자의 답과 결론은 과거와는 달라졌다.
과학자도 본질적으로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학은 이데올로기에서 완전히 독립된 영역일 수 없다. 제국주의 치하에서는 인종편견을 강화하는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에는, 인종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유네스코 성명 발표를 뒷받침하려는 과학적 시도들이 있었다. 시대상이 만들어낸 요구가 연구의 계획과 진행 과정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험 데이터를 신념에 부합하게 조작하는 행위와 같은, 연구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의 주제를 설정하고, 가설을 수립하고,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 읽는 이를 향한 시사점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학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견해에 미친 사회의 작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과학적 발견과 발견의 해석이 공고한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사회와 과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양방향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자신이 해당 연구를 하려는 이유를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또한 연구를 사회에 공개할 때 일으킬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회도 과학은 확실하고 불가침적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 연구의 결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동시에 하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과도하게 억압해서도 안 될 것이다. 사회와 과학은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를 바꾸기에, 그 속의 우리도 변화할 수 있음을 깨닫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 사회 속의 가치관과 연구 결과로부터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들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과정이, 인류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자 인류를 위한 ‘최선’에 가까워지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자연과학대학 홍보기자단 자:몽 김채원 기자 olleh9668@snu.ac.kr
카드뉴스는 자:몽 인스타그램 @grapefruit_snuc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강택구.(2018).19세기 후반기 미국 사회의 인종주의에 대한 검토.다문화콘텐츠연구,28(),7-26.
김호연. (2008). 과학과 이념 사이의 우생학. 동서철학연구, 48, 243-266.
박진빈. (2019). 인종주의의 역사와 오늘의 한국. 역사비평, 129, 293-317.
Burmeister, S. (2021). Does the concept of genetic ancestry reinforce racism? A commentary on the discourse practice of archaeogenetics. TATuP-Zeitschrift für Technikfolgenabschätzung in Theorie und Praxis/Journal for Technology Assessment in Theory and Practice, 30(2), 41-46.
Reich D. (2018). How Genetics Is Changing Our Understanding of ‘Race’. The New York Times.
Tiedemann, F. (1836). On the Brain of the Negro, Compared with That of the European and the Orang-Outa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126, 497–527. http://www.jstor.org/stable/108042
UNESCO. (1952). The Race Concept. UNESCO, Paris, France

![[2025 겨울 자몽 시리즈: 자연대의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8. 화학부의 순간들이 영상이 되는 곳, CUT](/webdata/newsroom/images/20260128/057z158z1bfz06bzbe1z403z6adzec2z303z71dzc9.png)
![[2025 겨울 자몽 시리즈: 자연대의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7. 화학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함께 배워가는, RxN](/webdata/newsroom/images/20260201/ab3z8cbz838z3bdz65eze6fzd5ez79bzdd3z0e3zb7.png)
